“절반이 일반인과 결혼?” … 대기업 총수 자녀 최근 10년 변화, 외국인·일반 직장인 배우자 급증
변화하는 재벌가 결혼 풍토
정략 대신 연애, 가문보다 개인

2018년, ‘야구 여신’으로 불리며 스포츠 아나운서로 인기를 끌던 이다희 전 아나운서는 돌연 방송계를 떠났다. 그리고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와의 결혼 소식이 전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정재계, 대기업 간 혼맥이 중심이던 재벌가 결혼 풍토 속에서, 연예계 출신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그녀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한때 한국 재벌가의 결혼은 기업 간 이해관계를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예를 들면, A그룹 총수의 자녀가 B그룹 후계자와 결혼하면, 두 기업은 형식적인 가족이자 실질적인 동맹이 된다.
정치권, 언론, 법조계와의 혼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혼은 인맥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결합을 가능케 했고, ‘혼맥’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며 사회 전반에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이 풍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대기업 총수 자녀의 절반가량이 일반 직장인, 외국인, 혹은 가족과 무관한 상대와 결혼하고 있다.
개인 중심 결혼,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장

2024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는 미국 해병대 장교와 결혼했다. 이들은 워싱턴DC에서 이웃으로 지내다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군’이라는 공통된 삶의 방식에서 유대감을 키웠다.
이 결혼은 국제결혼이자, 전통 재벌 혼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선택의 사례로 주목받는다.
그동안 ‘혼맥’으로 엮이지 않으면 내부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재벌가에서, 외부 인물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결혼 대상이 달라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재계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로 읽힌다.
외국 국적 배우자, 다양한 직업군과의 결혼은 기업의 폐쇄적 문화를 외부에 개방하는 동시에, 글로벌 감각을 지닌 3~4세대 후계자들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문의 이해관계’보다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우선시한다.
여전한 과시와 상징성, 결혼의 이중적 얼굴

그러나 결혼의 형식과 규모는 여전히 재벌가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창구로 기능한다. SK 최민정 씨의 결혼식은 SK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웨딩홀에서 비공개로 치러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러한 초호화 결혼식은 여전히 ‘우리 가문은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예식, 고급 호텔, 철저한 보안과 언론 차단, 재계 인사들의 얼굴이 등장하는 하객 명단. 이 모든 요소는 ‘결혼’을 하나의 사회적 퍼포먼스로 만들며, 기업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중에게 각인시킨다.
즉, 결혼의 방식은 개인화되고 자유로워졌지만, 결혼 자체의 상징성은 여전히 사회적 계급과 자본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재계의 새로운 풍경, 혼맥 없는 협업 시대

혼맥 중심의 재계 연대가 느슨해지는 지금, 기업 간 협업 방식도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사돈 관계를 통한 묵시적 유착이 아닌, 데이터와 실적, 전략 기반의 동맹이 이뤄진다. 이 같은 흐름은 재벌가의 결혼 풍토 변화와 직결된다.
혼인에 기반한 네트워크는 점차 그 효력을 잃고, 그 자리를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 논리, 전문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대체한다. 한국 재계는 이제 혼맥이라는 전통의 굴레를 넘어, 경쟁력과 혁신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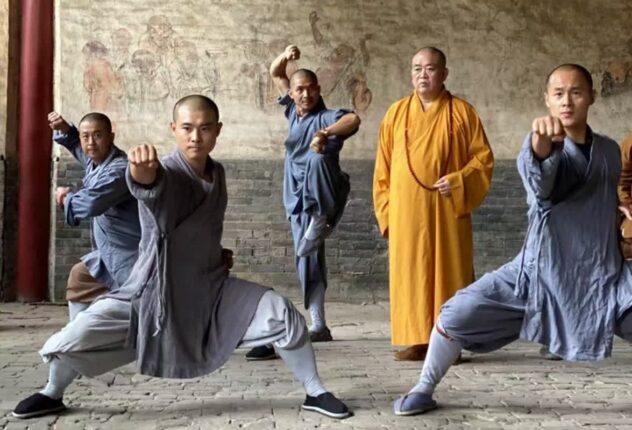











![[타이베이 여행 꿀팁] 타오위안공항에서 시먼딩역까지 대중교통 이동 가이드!](https://view-cdn.nate.com/nate-view/2025/10/14060444/CP-2022-0105-32949677-thumb-240x160.jpg)






















